오사키 요시오 '9월의 4분의 1 Quatre septembre'
여름 방학이 이제 막 끝나갈 무렵, 어쩌다가 학교 도서관으로 오게 되었다.
블로그에 몇개의 포스팅을 끝내고... 갑자기 생각이 찾아왔는데, "내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책을 읽었떤 때가..." 언제였던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취업 준비를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보니, 조용히 책을 읽을 시간을 거의 가지지 않았던 탓이다. 그런 이유로, 어차피 도서관에 있는 이 때, 도서관 문을 닫기 전, 아무 책이나 한두권 선정을 해서 대출을 해서 집에가서 읽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서관을 누볐다. 무슨 책을 읽을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책을 찾아다녔다.


9월의 4분의 1이라... 대체 왜 제목이 1/3도 아니고 1/4일까, 하는 생각이 책을 읽는 내내 머리 속에 맴돌았다. 1/3이라면, 한달은 약 30일에서 31일이니, 10일단위로 하면 계산을 하기도 쉬울터인데, 1/4이면... 1/3에 비해서 계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한달을 4등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궁금증은 책을 다 읽고나니, 이해가 되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제목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각각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두 다르며, 서로 연결고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야기 구성의 틀은 비슷하다. 주인공이 어딘가로 향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회상을 한다. 특별히, 어떠한 장소라든가, 어떠한 물건에 대해 얽혀있는 내용을 풀어나가는 형식이다. 게다가 시간이 현재로 왔다가 과거로 왔다가 왔다갔다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과거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싶을 시점에 다시 시점은 현재로 돌아오는 구성을 가졌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게 되면서 책에 더 몰입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단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뭔가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왠지 그 뒤에 뭔가 이야기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여운이 남기 때문이다.
각 단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 이야기인 보상받지 못한 엘리시오를 위해라는 이야기는, 대학생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체스"라는 게임과 "체스를 연구하는 동아리"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삼각관계에 처해 있는 남녀의 사랑이야기이지만... 그 속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두 번째, 켄싱턴에 바치는 꽃다발이라는 이야기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영국인 여자와 일본인 남자, 두 사람인데, 이 이야기도 "장기"라는 게임에서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주인공은 "장기 팬"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인데, 자신이 은퇴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고 은퇴를 결심한 상황에서,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아들게 된다. 그리고, 그에 얽힌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형식이다.
세 번째 이야기인 슬퍼서 날개도 없어서라는 이야기... 여기에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소재는 음악이다. 하지만, 결국 그에 얽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풀어낸다.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9월의 4분의 1"이라는 제목의 단편 이야기는 파리에서 만난 인연에 관한 이야기인데...
책의 마지막에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이야기를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실존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해둔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존재와 실존의 차이에 대해서...

아무튼, 단순히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집어 들었는데, 오랜만에 감수성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책을 읽어보게 된 듯해서 기분이 좋다.
나도 기회가 있다면, 이런 구성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서 써보고 싶은 마음이다. 물론, 개인적인 욕심에 그치고 말 수도 있겠지만...
여름 방학이 이제 막 끝나갈 무렵, 어쩌다가 학교 도서관으로 오게 되었다.
블로그에 몇개의 포스팅을 끝내고... 갑자기 생각이 찾아왔는데, "내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책을 읽었떤 때가..." 언제였던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취업 준비를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보니, 조용히 책을 읽을 시간을 거의 가지지 않았던 탓이다. 그런 이유로, 어차피 도서관에 있는 이 때, 도서관 문을 닫기 전, 아무 책이나 한두권 선정을 해서 대출을 해서 집에가서 읽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서관을 누볐다. 무슨 책을 읽을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책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몇권의 책이 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9월의 4분의 1"이라는 책이었다. 그냥, 단순히 책 제목의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한권을 선정하고, 읽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9월의 4분의 1이라... 대체 왜 제목이 1/3도 아니고 1/4일까, 하는 생각이 책을 읽는 내내 머리 속에 맴돌았다. 1/3이라면, 한달은 약 30일에서 31일이니, 10일단위로 하면 계산을 하기도 쉬울터인데, 1/4이면... 1/3에 비해서 계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한달을 4등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궁금증은 책을 다 읽고나니, 이해가 되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제목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책에는 총 4개의 짧은 단편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보상받지 못한 엘리시오를 위해"라는 제목의 이야기...
두 번째는 "켄싱턴에 바치는 꽃다발"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세 번째는 "슬퍼서 날개도 없어서"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야기가 바로 "9월의 4분의 1"이라는 이야기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보상받지 못한 엘리시오를 위해"라는 제목의 이야기...
두 번째는 "켄싱턴에 바치는 꽃다발"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세 번째는 "슬퍼서 날개도 없어서"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야기가 바로 "9월의 4분의 1"이라는 이야기이다.
각각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두 다르며, 서로 연결고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야기 구성의 틀은 비슷하다. 주인공이 어딘가로 향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회상을 한다. 특별히, 어떠한 장소라든가, 어떠한 물건에 대해 얽혀있는 내용을 풀어나가는 형식이다. 게다가 시간이 현재로 왔다가 과거로 왔다가 왔다갔다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과거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싶을 시점에 다시 시점은 현재로 돌아오는 구성을 가졌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게 되면서 책에 더 몰입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단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뭔가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왠지 그 뒤에 뭔가 이야기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여운이 남기 때문이다.
각 단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 이야기인 보상받지 못한 엘리시오를 위해라는 이야기는, 대학생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체스"라는 게임과 "체스를 연구하는 동아리"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삼각관계에 처해 있는 남녀의 사랑이야기이지만... 그 속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두 번째, 켄싱턴에 바치는 꽃다발이라는 이야기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영국인 여자와 일본인 남자, 두 사람인데, 이 이야기도 "장기"라는 게임에서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주인공은 "장기 팬"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인데, 자신이 은퇴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고 은퇴를 결심한 상황에서,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아들게 된다. 그리고, 그에 얽힌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형식이다.
세 번째 이야기인 슬퍼서 날개도 없어서라는 이야기... 여기에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소재는 음악이다. 하지만, 결국 그에 얽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풀어낸다.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9월의 4분의 1"이라는 제목의 단편 이야기는 파리에서 만난 인연에 관한 이야기인데...
책의 마지막에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이야기를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실존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해둔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존재와 실존의 차이에 대해서...

아무튼, 단순히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집어 들었는데, 오랜만에 감수성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책을 읽어보게 된 듯해서 기분이 좋다.
나도 기회가 있다면, 이런 구성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서 써보고 싶은 마음이다. 물론, 개인적인 욕심에 그치고 말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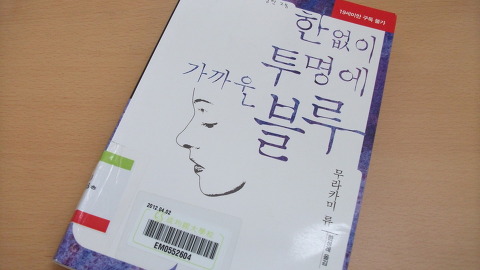



댓글